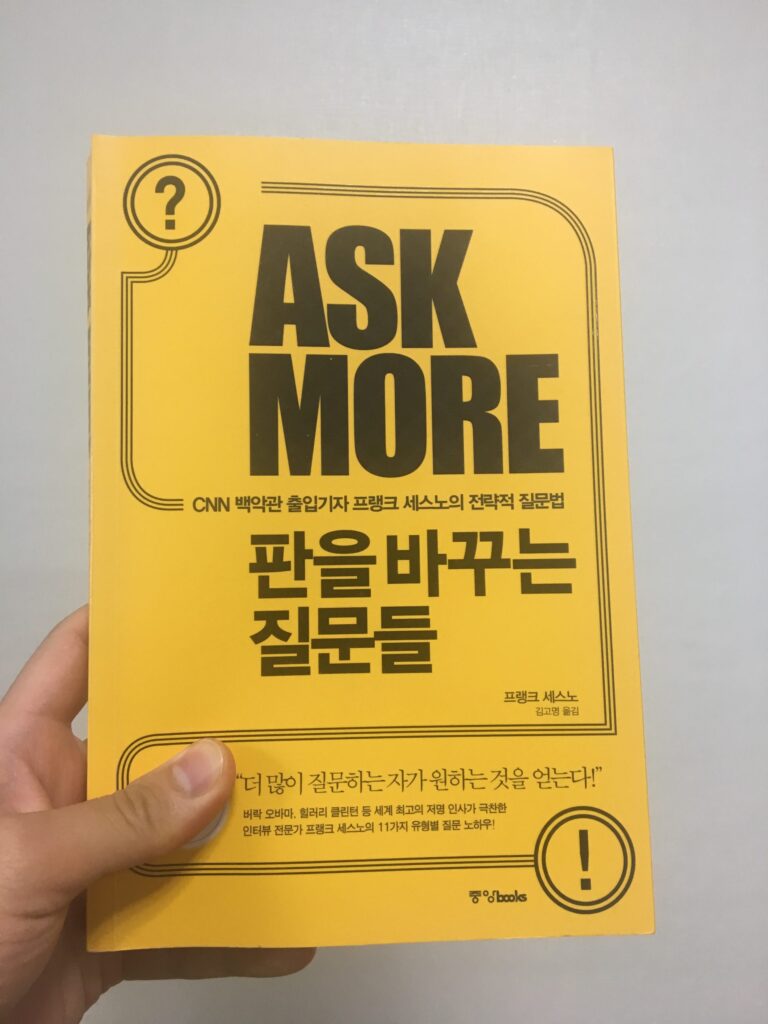읽게 된 동기
STEW 독서소모임 지정 도서. 내가 발제자로 이 도서를 지정했다. 기자 시절 인터뷰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질문의 힘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다.
한줄평
요즘 삶에 질문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왜 질문이 없어졌을까? 질문을 시작해본다.
서평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잘 벼려진 질문은 칼보다 무섭고, 적시에 파고드는 적절한 질문은 분위기를 바꾼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고, 꼼짝 못 하게 만들기도 한다. 보이는 만큼 던질 수 있고,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다.
사회에 나오기 전 여러 교육 기관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사회에 나와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다. 새로움 앞에 설 때면 가끔 눈앞의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때가 있다. 말 그대로 ‘명함도 못 내민’ 적도 많다. 차마 얕은 질문을 던지기 부끄러워 입을 닫을 수밖에 없던 적도 많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던져야 한다. 성장의 시작은 현재 바닥을 인지하면서 시작된다. 그다음은 인정 그 후 비로소 어떤 행동이든 취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껄끄럽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STEW 독서소모임 친구들과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선택했다. 이 책은 지난해 IT 기자로 일하던 때 집었던 책이다. 당시 나는 ‘개발하는 기자, 개기자의 개발자 인터뷰’ 일명 <개터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었다. 온갖 핑계 속에서 책을 읽지 않았지만, 이 책을 읽고 사색을 했더라면 이후 개터뷰는 좀 더 농익었을 거라 생각한다.
<ASK MORE, 판을 바꾸는 질문들> 잃어버린 내 질문력을 ‘인지’하고, ‘인정’하게 해준 이 책,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 그래서 왜? 왜? 왜?
책을 읽으며 과거 치열했던 내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은 그저 귀여운 질문이지만, 당시엔 꽤 진지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하는지, 뭘 해도 되는지, 뭘 하면 좋을지. 딱히 근거 없는 질문만 던졌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만 무슨 수든 쓸 수 있다.”
당시 내 질문에 깊이를 더한 것은 책이었다. 방향을 잃을 땐 책이 최고였다. 책은 늘 옳은 방향을 가리키진 않지만, 어떤 방향이든 가리킨다. 방향을 잃어 어디도 가지 못할 땐, 어디든 가는 게 도움이 됐다. 그러려면 어디든 가리키는 책이 꽤 안정감을 줬다.
책을 고르는 것도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꽤 운이 좋은 편이다. 딱히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즐기던 방법은 있다. 중고서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중고서점에 꽂힌 책은 누군가 돈을 내고 산 책이다. 누군가 돈을 주고 살 만큼 눈에 띄었다는 것이고, 나는 누군가의 선구안에 기대어 숟가락을 얹으면 된다. 내게 ‘누군가 샀다가 판 책이잖아?’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운이 좋다는 것이다. 중고서점에서 제목만 보고 고른 책들이 꽤 성공률이 높았다. 여기서 성공률이란, 내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때때로 적절한 인물이 나타나 내게 동기부여를 했다. 나는 꽤 운이 좋은 편이다. 에너지가 떨어질 때면 적절한 인물이 나타났다. 평소 만날 수 없는 거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물이 나타나기도 했다. 나와 무척 비슷해 내 말이면 함께하는 인물을 만나기도 했고, 내게 큰 힘을 주는 인물도 만났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생각나던 인물은 내게 많은 질문을 던졌던 친구다. 그래서 내가 운이 좋다는 것이다.
나와 한방을 썼던 룸메이트를 나는 ‘집사람’이라 불렀다. 법대를 나온 집사람은 내 첫 회사 동기였다. 나는 개발자, 그는 법무 담당으로 입사했다. 공감대가 없을 것 같았던 집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꽤 잘 맞았다. 2년 정도 한 집에서 생활했는데, 치킨을 먹으며 주고받던 질문이 떠오른다.
나 : “저 사람 멋진 것 같아.”
집사람 : “왜?”
나 :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을 발표하잖아? 인사이트도 좋다고.”
집사람 :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 발표하는 게 멋있어?”
나 : “멋있지. 안 멋있어?”
집사람 : “세용이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 발표하는 게 멋있구나.”
나 : “? 그게 안 멋있어?”
집사람 : “응. 난 별로.”
나 : “왜?”
집사람 : “? 세용이는 그게 왜 멋있는데?”
나 : “?? 어… 책도 많이 읽은 것 같고, 저거 준비도 많이 했을 거야. 아마, 글도 잘 쓸 거야. 이야기가 잘 정제돼 있거든.”
집사람 : “응. 세용이는 책 많이 읽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멋있나 보네. 너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나 : “그러네”
적고 보니 참 재미없는 대화 같다. 우리는 이런 대화를 수도 없이 나눴다. 서로 놀라는 식이었다. 우리는 한 가지 장면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했고, 존중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음이 때로는 당연했다.
“헬런은 내게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집사람과 대화를 통해 ‘나’를 배웠다. 내가 멋있어하는 사람은 꽤 일관됐다. 그들이 보이는 모습, 행동, 말투 등을 나는 선망했다. 그리고 집사람은 그들의 캐릭터를 잘 파악했다.
집사람은 내게 자주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꼭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마치 소크라테스인 양 묻고, 또 묻는 집사람 덕분에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 깨닫게 됐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소크라테스를 대화에 좀 더 초대해볼 만 하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쟁점이나 껄끄러운 결정을 논할 때 말이다.”
집사람이 이직하고, 나는 기숙사를 혼자 쓰게 됐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홀로 묻고 답하는 것을 시작한 것 말이다. 책에서 묻고, 내 질문의 꼬리를 무는 시간은 홀로 쓰는 기숙사 방 안에서 계속됐다.
어쩌면 나는 책이 아닌 ‘나’를 따라왔는지도 모른다.
◆ 내가 개발자를 그만둔 이유 그리고 다시 개발자가 된 이유.
2015년 12월. 4년 2개월간 개발자 생활을 마치고, 퇴사했다.
스타트업이 하고 싶었다. 이왕이면 대표가 되고 싶었다. 그동안 틈틈이 연습한 아이템을 살려 <도밍고컴퍼니>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었다. 아이템도 있고,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잘 안됐다.
밥은 먹어야 했다. 정신을 차리니 프리랜서 개발자로 밥을 먹고 있었다. 몇몇 팀원을 구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생존할 수 없었다. 스타트업 대표라곤 하지만, 실상은 그저 프리랜서 개발자였는지도 모른다.
기회가 왔다. 내 경험을 지켜보던 사람이 IT 기자로 일할 기회를 줬다. 고민이 됐다. 커리어를 바꾸는 압박감은 가볍지 않았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느낌이 들었다. 생각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나는 내게 물었다. 왜 망설이는지, 내 선택으로 잃는 것은 뭔지, 얻는 것은 뭔지. 1시간, 2시간. 나는 가만히 앉아서 질문을 던지고, 적었다. 몇 가지 이유, 몇 가지 이유에 관한 시나리오를 적었다. IT 기자에 도전하기로 했다. 도전의 근거는 내 질문과 답변에 다 적혀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IT 기자가 된 지 1년이 흘렀다. 나는 다시 내게 물었다.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에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했다.
내가 얻을 거라 생각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 내가 잃을 거라 생각했던 것을 잃지 않았다. 바둑판 위 바둑알을 봤다. 막연했던 상황이 정리됐다. 내가 다음에 놓아야 할 바둑알 위치가 눈에 보였다.
나는 다시 개발자로 돌아왔다. 떠나기 전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 됐다. 내가 물었던 질문에 관한 답을 찾기도, 찾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때로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답이 되기도 한다.
나는 개발자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 사색 노트
내 현재를 만든 수훈 갑은 단연 <사색 노트>다. 2011년 에버노트가 핫했는데, 딱히 적을 게 없던 나는 일기를 적기 시작했다. 감성을 넣고 싶어 일기장 대신 <사색 노트>라 정했다.
내게 사색 노트는 내 삶의 많은 굴곡을 기록한 역사서다. 내 분노, 슬픔, 기쁨 등을 모두 적으려 노력했다. 내 성장기가 온전히 담겨있고, 누구도 보여줘선 안되는 비밀 노트다. 누군가 ‘무인도에 가져갈 단 한 권’ 따위의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사색 노트를 가져간다고 말하겠다. 그러면 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사색 노트>가 뜸했다. 방금 펼쳐보니 무려 한 달간 작성하지 않았다.
사색 노트를 붙잡고 씨름한 수많은 밤이 떠오른다. 사색 노트가 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색 노트를 쓰지 않은 나는 내가 아닐까? 사색 노트를 쓰지 않고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쩌면 내가 더 이상 사색 노트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어쩌면 더 이상 사색 노트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더 이상 가지고 놀 수 없게 된 장난감이 생각난다. 마치 영화 <토이 스토리>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장난감 없는 놀이를 알게 돼 실컷 즐기다, 문득 장난감의 존재를 떠올린 소년 같은 기분이랄까?
그런데, 갑자기 즐겁지 않은 기분이랄까?
◆ 다시 소년으로, 그래서 왜?
올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이직을 했고, 이사를 했다. 전에 없던 많은 소비로 인해 통장이 비워졌고, 새로운 도전이 눈앞에 쌓여있다. 함께하던 많은 친구가 주변을 비웠고, 그보다 더 많은 친구가 주변을 채웠다. 많은 것을 얻었고, 잃었다. 잃은 만큼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하다. 잃어버린 장난감은 어쩌면, 내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던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만 무슨 수든 쓸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가지게 된 많은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따라가던 것은 ‘나’ 였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껄끄럽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다시 나로 돌아간다. 나로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까? 잃어버린 내가 돌아올 수 있게 기다리면 될까? 잃어버린 내게 북극성은 뭘까? 나는 내 북극성이 될 수 있을까?
“절대 실패할 리 없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질문을 다시 시작한다. 어쩌면 너무 멀리 와버린 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왜 ‘나’를 찾아야 할까? 내가 아닌 ‘나’는 뭘까? 놓았던 내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발견한 것 같다.
어디서 잃어버린 지 모를 나를 찾기 위해, 수 없이 읽은 책들을 뒤로 한 채, 수 없이 쓴 사색 노트를 뒤로 한 채 그저 내게 묻고 싶다.
어디로 갈까?
인상 깊은 문구
-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만 무슨 수든 쓸 수 있다.
- 문제를 해결하려면 껄끄럽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 진단형 질문을 잘하고 싶으면 누구나 외면하기만 하는 것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바로 ‘나쁜 소식’이다.
- ‘무엇이 잘못됐는가?’ 물으려면 나쁜 소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 먼저 상황을 진단한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법이다.
- 내 앞에 어떤 과제나 기회가 있는지 밝히자. 그게 왜 중요한지 묻자. 목표를 분명하게 표현하자. 거기에 내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가?
- 내가 무엇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 하지만 훗날 실제 전쟁을 통해 밝혀졌다시피 후세인에게는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 첩보가 틀린 것이었다. 미국 전부가 마땅히 질문해야 할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않은 탓이었다.
- 그는 그 일에 열정이 없었다. 그리고 가족들도 반대였다. 특히 수년 전부터 한 번씩 우울증이 도지는 부인 알마가 그랬다. 선거운동도 고생길일 게 뻔했다. 만약 그가 당선되어 그녀가 백악관의 안주인이 된다면 대중 앞에서 어마어마한 중압감에 시달릴 텐데, 도저히 그런 희생을 부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파월이 후보로 나서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 연구 결과를 보면 공감 능력이 풍부한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의사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치료를 잘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공감 능력이 치료 효과 향상, 스트레스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 헬런은 내게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것” 이라고 했다.
- 집중하는 경청자와 공감하는 질문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배리는 노벨상 수상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의 심리 이론을 따른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뇌가 두 가지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시스템1’은 일종의 저속 기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어디서든 작동하며 우리가 쉽게 결정을 내리고 즉답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 우리 뇌의 자동항법장치라고 보면 된다. 이것은 주변 환경과 기준점이 우리에게 익숙할 때 작동한다. 예를 들어 누가 2 더하기 2는 얼마냐고 물으면 무심코 4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이다.
- 물음표 없는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위협받고 심문받는 느낌이 덜할 수 있다.
- 내가 사용하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는 물음표가 분명히 있는 질문도 있다. 나는 이를 ‘메아리 질문’이라 부른다.
- 대의를 생각하면 투지가 생긴다.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면 권위가 생긴다. 주의 깊게 들으면 기회가 생긴다.
- “나는 인터뷰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가정합니다. 하나는 내가 안 물으면 아무도 안 물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과 앞으로 두 번 다시 대화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우리 모두 힘 있는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고 또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 창조형 질문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상상하게 한다. 창조형 질문은 황당한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뻔한 아이디어를 묵살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창조형 질문의 핵심은 미래다. 그러니 미래로 가보자. 미래의 시점에서 질문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미래로 가자고 청하자.
-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미래입니다. 방금 전국 대학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우리 학교가 최상위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 미래에 대해 현재 시제로 묻자. 미래를 뚜렷이 밝혔으면 이제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찾자. 물론 생각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기준점을 통과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역경을 이겨내야 할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물을 수 있다.
- 한번은 에드가 일부러 엉망으로 쓴 대본을 제작진 회의에 가져가서 혹시 지적하는 사람이 있나 봤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는 팀원들이 무작정 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으로 창조적인 작업을 하게 하려면 그들을 이끄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통치며 명령할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야 했다.
- 출판사를 운영하는 내 친구 제이가 고위 편집자들과 워크숍을 떠났다. 그 자리에서 그는 먼저 한 가지 활동을 제안했다. 가상 상황을 설정해서 그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는 출판사에 위기가 닥쳐서 모든 잡지의 예산을 50퍼센트 삭감해야만 한다고 가정했다. 직원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삭감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편집자들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산을 해가면서 직원, 비용, 페이지 수를 줄이고 종이 품질과 마케팅에서 원가를 절감할 방안을 강구했다. 판매 부수와 관리운영비를 검토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워크숍 활동일 뿐이었으나 모든 사람이 동조해서 진재하게 고민했다. 그러다 반전이 생겼다. 뜻밖에도 제이가 편집자들에게 방금 삭감한 돈을 돌려준 것이다. 단돈 1 센트도 빠짐없이. 하지만 그는 편집자들에게 조금 전에 줄였던 예산액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삼으라고 했다. 그들이 ‘절감한’ 비용은 어디든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었다.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그 대답을 토대로 이 출판사는 현실에서 잡지 5종을 쇄신하고 내셔널 매거진 어워즈에서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상을 거머쥘 수 있었다. 회사의 순이익도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 맥킨지 집필진은 “뇌가 정보를 재분류하여 습관적 사고 패턴을 초월하도록 강제할 때만 진정으로 참신한 대안을 상상할 수 있다”고 썼다.
- 절대 실패할 리 없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 “고객을 만족시켰다는 건 그냥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켰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업계에서는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기대를 초월해야죠.”
- 손님을 대하는 직원은 누구나 ‘뒷수습이나 손님의 즐거움’을 위해 하루 2,000달러 내에서 재량껏 지출하거나 외상이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직원들이 조직 문화에 물들게 하려면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게 그녀의 설명이었다.
- 자신이 어떤 유형의 경청자인지 알면 타인의 말을 더 잘 듣고 이어서 던져야 할 질문이나 탐색해야 할 영역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해버리기 일쑤다.
- 과학에 완전한 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왜?’에 대한 답이 다시 무수히 많은 ‘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연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한다.
- 현실에서는 이런 유의 질문을 동반하는 사고방식을 굳이 생활과 업무에 적용하게 할 유인책이 별로 없다. 상사 앞에서 “저한테 신제품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다.
- 여기 요술 지팡이가 있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 역대 최악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소크라테스를 대화에 좀 더 초대해볼만 하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쟁점이나 껄끄러운 결정을 논할 때 말이다.
- 말기 간호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인생과 자기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고 믿는다.
- 한 49세 여성은 “내가 따분하고 무미건조한 삶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을 종이에 적어놓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지 보는 눈이 열렸다.”고 밝혔다.
- 어떤 사회에서는 질문을 노골적인 위협으로 여긴다.
-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데리고 다니기가 좀 힘든 분이군요.”라고 북한 측 보호관이 그녀에게 말했다.
- 내 질문 앞에서 열다섯쯤 된 아이들은 지친다는 듯이 눈을 굴리기도 했다. 아들은 “아빠, 저녁 먹을 땐 기자 일 좀 그만해요”라고 말하곤 했다.
- 이제껏 내 인생이 모든 단계에서 풍요로웠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질문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