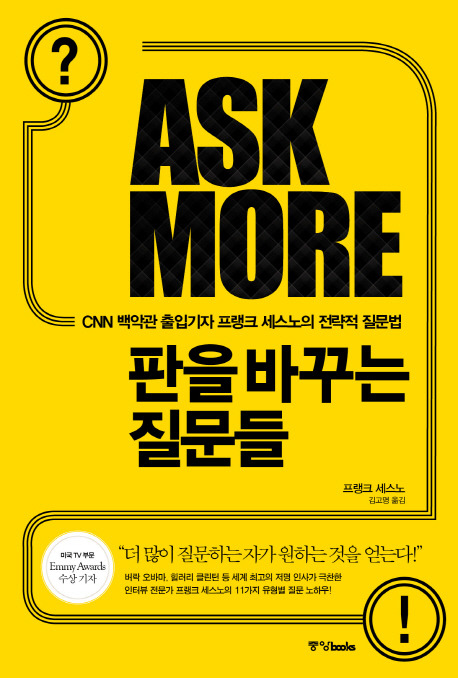*한줄평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에 다리를 놓는게 아닐까.
*책을 읽고나서
초등학교 6학년때 나의 과외선생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셨다. “동영아 하루에 질문 10개만 하면 안돼?”. 어린시절의 나는 정말 궁금한것이 많았고, 그것은 곧 내 과외선생님의 몫이었다. 그중 아직도 기억나는 질문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몇이에요?”였다. 물론 공부하다가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궁금해졌었다.
나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아는것이 매우 즐겁다. 게임으로 치면 스킬을 하나 배우거나 스킬 레벨을 올리는 느낌이다. 새로운것을 알거나 배울수 있는 기회는 지식 또는 능력의 결핍으로부터 생긴다. 어릴때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무식함을 뽐냈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여러 지식과 능력의 성장을 얻어갔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눈치’를 보게된것 같다. 중학교 2학년때, 한 교실안의 학생들은 43명이었다. 나는 중학교 내내 수업중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 수업중에 입을 굳게 다물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나는 이겨내지 못 했었다. 대중들 앞에서 나의 결핍을 보이는 일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혹시나 “멍청한 질문은 아닐까?”, “나만 빼고 다 아는건 아닐까?”이러다가 기회는 지나가 버렸다. 결국 나는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거나 , 그냥 내가 나중에 찾아보자고 생각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질문 하는 갯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나갔다. 이번에도 결국 그냥 나 혼자 찾아보자였다. 이 책에 나오는 말 중 이런말이 있다.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과거를 돌이켜보니 통계적으로 95%이상 맞는거 같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은 즉슨, 나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것과 같다는 말이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g20으로 한국에 왔을때, 한국의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하지 않자 중국의 기자가 질문의 기회를 뺏어간것이 생각난다. 안타까웠지만, 내가 거기 있었어도 나도 똑같았을것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느꼈다.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과의 정서적 교류의 절단을 의미하며, 성장의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는것을 의미한다. 질문을 하자. 그리고 공감을 하자.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질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책을 읽으면서
-에디슨의 인재를 찾기위한 방법
에디슨의발명가 에디슨의 면접 질문 그는 엄청나게 밀려들어오는 구직자들을 일일이 다 면접을 볼 수가 없어서, 141개의 질문으로 시험지를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의 대기업 인적성 시험의 시작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어떤 인재를 골라낼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기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에디슨은 전구같은 발명품 뿐만 아니라 이런 채용 시스템 까지 발명했단 말인가? 이 사람은 뭘 해도 잘 했을것 같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최고의 호스트는 최고의 질문자이다.
저녁 식탁에서, 회사에서, 사교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안건을 정학,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나누며 서로에게 자극과 놀라움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절정의 소리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명연주자처럼 탁월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띄워 극찬을 받는 명질문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정말 무릎을 탁 치는 말이었다. 최고의 호스트는 최고의 개그맨이 아니라, 최고의 질문자라니. 질문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고의 질문자, 그것이 최고의 호스트라는 말에 매우 공감한다.
-한 단어 질문
저자가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에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저자는 하나 또는 두 단어의 질문을 한다. 그러면 펠로시는 역시 하나 또는 두 단어로 대답을 한다. 그런데 저자는 자신이 알고싶은 내용을 두 단어에 담아서 질문하고, 펠로시 역시 자신의 생각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 단어에 담아서 전달한다. 그 예로, “민주당은 줄곧 ‘큰 정부론’을 옹호해오고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그들을 두고 혈세를 걷고 쓰는 재미에 빠진 진보라 일컫곤 한다. ‘세금?’. 펠로시는 잠깐 생각한 뒤 대답했다. ‘투자’”. 민주당의 세금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관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대답이었다. 이렇게 짧은 질의응답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게 정말 놀라웠다. 실제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펠로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빠르고 대략적으로 알게 됐다. 비유를 하자면 골프에서 첫 번째 장타로 골인 지점 근처로 보내는 느낌일까. 토론에서 복잡하고 장황한 말들을 통해 토론을 하곤 하는데, 그래야지만 의미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건 아닌가 싶다. 나도 친구와 한, 두 단어의 질의응답 토론을 해보면 재밌을것 같다.
마지막 문단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적었다. 질문은 우리가 타인과 이어지는 길이다. 나는 질문이야말로, 모방이 아니라 상대방을 가장 진실하게 치켜세우는 방법이라 믿는다. 좋은 질문을 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흥미와 호기심이 표출된다. 속도를 늦추고 주의 깊게 듣고 더 묻자. 그러면 더 깊이 교류하게 된다. 관심과 애정이 표현돈다. 신뢰가 형성된다. 공감하게 되고 차이를 잇는 가교가 생긴다. 더 좋은 친구, 동료, 혁신자, 시민, 리더 가족이 된다. 미래가 만들어진다. 질문에서 그 이상 더 바랄게 있으랴.
*인상깊은 문구
- 무엇을 어떻게 묻느냐 에서 내 지식, 관심, 열의가 드러난다. 영리한 질문 10개를 작성하고 묻는 연습을 하자.
- 좋은 진행자는 질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웃음이나 즐거움을 선사하거나 엉뚱한 상황으로 들어간다.
- “나는 인터뷰에 들어갈 때 두가지를 가정합니다. 하나는 내가 안 물으면 아무도 안 물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과 앞으로 두 번 다시 대화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