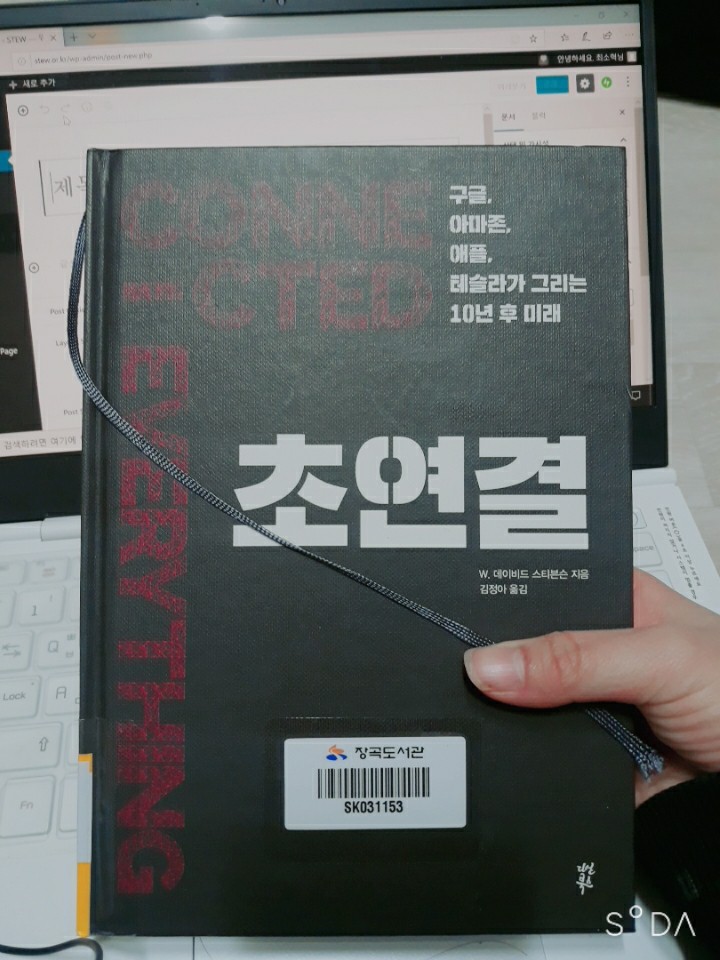한줄 평: 20% 아쉬운 책
별점:★★★★
4차 산업혁명 산물로서 새로 개발된 기술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잘 예측도 되지 않고 크게 관심도 없다. 왜냐하면, 제일 훌륭한 기술이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겪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인공지능 시리나 빅스비처럼 불편하고 이질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점이 점차 개선된다면 편리해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현재까지 신기술들을 이용해 만들어진 앱이나 제품들은 사용 시 고객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하지만, 굳이 편리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편리하게 해주거나, 너무나 세부적이고 복잡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을 통해 고객이 즉석으로 옷을 제작할 수 있는 가게라던가, 전신피팅 거울이라던가, 온라인상 자신 만의 아바타에게 옷을 입혀볼 수 있는 쇼핑몰이라던가, 아주 세부적인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Health care 앱이든지 말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책들을 몇 권 읽었던 적이 있었지만 모두 중도 포기했다. 왜냐하면 서사가 없이 객관적인 정보들만 수두룩하게 나열되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지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클라우스 슈밥의 제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싶다.
초연결은 책이 나온 시점이 제 4차 산업혁명에 비해 훨씬 최근이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기술이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윤곽이 잡혔다는 것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다.
항상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들을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관련업계 종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책이 제공한 정보들이 얼마나 정확한 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하다. 하지만, 일단 감지기를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 및 응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품을 만들고 이를 신사업으로 도입하는 것이 21세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는 길이라는 작가의 주장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어서 내가 읽었던 4차 산업혁명 관련 책 중에 2번째로 마음에 들었다.( 첫 번째로 마음에 든 책은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었는데, 모노츠쿠리 정신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 다루고 이를 4차 산업혁명과 적용했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관해 서, 본, 결론이 명확히 드러난 책이었다)
하지만, 목차를 1부 혁명 ‘선점할 것인가, 바라만 볼 것인가’ 2부 선구자들 ‘디지털 기업이 되든가, 망하든가’ 3부 혁명이 끝난 뒤 ‘연결될 것인가, 고립될 것인가’ 이렇게 거창하게 써 놓은 것에 비해 각 내용이 대부분 흥미로운 사례제시나, 비슷한 사례의 반복이 계속되고, 내용을 다 읽고 나서도 왜 각 목차의 제목을 저렇게 정한 것인지 잘 연결이 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그래도 비교적 1부와 2부는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왔던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은 신기하기만 할 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1부에서 소개된 감지기를 통한 제품들은 모두 필수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행기 엔진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예측 보수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한다던 지, 쓰레기통이나, 석유저장통에 감지기를 설치해 정기 검진이나 수거가 아니라, 예측 검진과 수거를 한다던 지의 사례들은 매우 흥미로웠다. 또 그러한 기술로 절감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기업에 LOT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 리콜 문제에 있어서 LOT 가능 이전 시대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 모든 자동차를 무상 수리해주고 기업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그것도 새벽에!!) 모든 자동차를 무상수리 했으며, 도요타에 상응하는 고객 신뢰도를 얻었다는 점에서 LOT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오세용 팀장님의 서평을 읽었기 떄문에 작가가 말하는 LOT의 정의가 맞는 것인지 잘 확신이 되지 않지만, 감지기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 및 응용을 Internet Of Things의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책은 완전 이과 분야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항상 거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술술 읽혀 책 분야를 찾아보니 경제경영 도서라는 것에 크게 놀랐다. 왜냐하면, 기업의 본질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있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 이과적 영역이라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 분야 책이 경제경영 필수도서가 된 것을 보면, 수익창출의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디지털 쌍둥이 기술을 매우 강조했는데, 일단 엄청 편리해지기는 하겠지만, 나는 이 기술을 접하고 나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쨰는 디스토피아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아 조금 거부감이 들었고 둘째는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과적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겼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과연 보편화될까?에 대해서 였다.
작가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 고객은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기술인데 그 기술들이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한다면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기술이 발전되는 만큼 그 기술을 어떻게 보편화 평등화 시킬지에 대해서도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부에서는 역사가 있는 대기업들이 어떻게 시대에 맞춰 기업을 혁신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룬 내용이었다. 주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자원들 (기업 신뢰도나 무수한 고객들)을 잘 이용하여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마련해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책을 가장 아쉽게 만들었던 것은 3부였는데, 혁명이 끝난 뒤 연결할 것인가 고립될 것인가라는 부제는 내용과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았을 뿐 더러 비슷한 사례와 잡다한 사례의 나열이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1부와 2부로 끝내고 작가의 생각을 담은 마무리 글을 3부에 간략하게 썼더라면 책도 더 얇고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