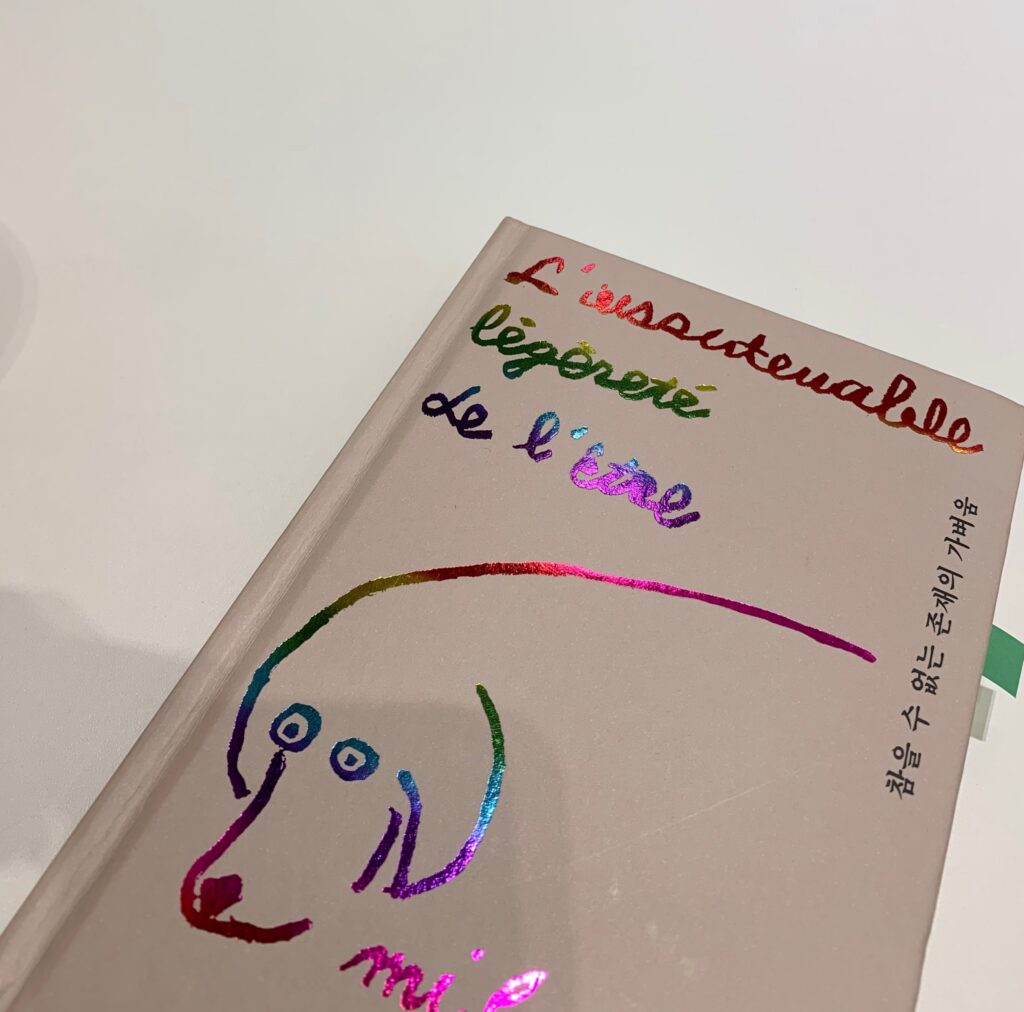8월 마지막날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 책을 완독했다. 초반에 조금 달리다가 중간에 갑자기 지루하게 느껴져서 덮어두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심각해져셔 강제 집콕라이프를 하게 되기도 했고, 곧 서평 써야 할 날이 다가오는 기운(?) 을 느끼면서 책을 다시 펼쳤다. 이 책을 읽던 나의 모습은 부푼 기대 > 약간의 실망 > 다시 생긴 호기심 > 흠… > ?! 순서로 설명된다. 분명 완독은 했는데 어딘가 가려운 곳이 덜 긁힌 느낌이었다. 평소 책을 읽을 때 1회독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주 갖고는 하지만, 이 책은 뭔가 다른 느낌의 찝찝함(?) 을 안겨주었던 것 같다. (찝찝하다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각각의 시선을 통한 서술이 꽤 흥미로웠다. 테레자, 토마시, 사비나, 그리고 프란츠까지 적어도 그 부분을 읽는 동안은 나는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침투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한 예로 토마시가 테레자를 처음 만나 첫눈에 반하고, 한 줄기의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은 억지스러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설레이는 감정도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서술하다가 사이사이에 툭툭 튀어나오는 작가의 생각들, 그리고 철학들을 읽어내는 은근한 재미도 있었다. 작가의 말들 중에서는 꽤 공감가는 문장들이 있어서 나올 때 마다 메모지에 한자 한자 눌러서 적어두었다.
아무도 모르는,
테레자의 솔직한 내면의 심리,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비참한 생각들이 가감없이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그녀가 들고있던 책 한 권이 상징하는 바, 신분 상승의 욕구, 술집에서 당한 수모로 인해 받은 수치스러움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늙은 토마시를 보며 느끼는 죄책감.. 처음부터 끝까지 테레자의 깊은 내면의 심리를 파헤치며 글을 읽어나갔다. 유년기에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깊게 자리잡힌 테레사는, 사랑 앞에 당당할 수 없었다. 토마시에게 솔직하게 불만을 말하고 싶은데, 바람피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가 떠나갈까봐 말하지 못하는 테레자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티를 내고 싶은 그녀의 유치한 행동들도 이해가 가며 안타까울 정도로 사랑에 목매는 테레자가 가여웠다. 그녀에게 토마시는 세상의 전부였다. 진짜 운명이건, 운명으로 가장한 우연이건, 토마시는 테레자에게 희망이었고, 미래였다. 나는 테레자에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당신은 토마시 없이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입밖으로 꺼낼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았다.
늘 피하고 싶은 선택의 순간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번 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번째, 세번째, 혹은 네번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는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A안과 B안이 있을때. 단 1 퍼센트라도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종종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 내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조금이라도 나은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 선택을 해야하는 그 상황을 두려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돌이킬 수 없으니까.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조금이나마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원하니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A를 고르던, B를 고르던, 내가 한 선택에 대해 100퍼센트 만족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99퍼센트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1 퍼센트는 결국 후회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의 후회가 항상은 남기 마련이다.
이 책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무거움과 가벼움의 모순이 선택에 관한 나의 평소 생각을 이끌어냈다.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것과 같이 가벼운것이 긍정적이고, 무거운 것이 부정적일까? 반대로, 베토벤이 말하는 필연적인 것, 무거운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토마시가 그동안의 바람을 정리하고 의사의 삶을 포기하며 테레자와 함께 무겁게 살아가는 것만이 옳은 선택일까? 보헤미아 귀족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권 대사 두명을 내던져 버린게 과연잘 한 선택일까?
리허설 없는 인생이다. 우리에게 두번째, 세번째 인생은 없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완전한 선택이란 없다. 우리는 무거움과 가벼움이 뒤섞여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이다. 정답은 없다. 이분법적으로 정의할 수도 없다. 그래야만 하는 것도 없고, 한번만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내면에 축적되어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될 가능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자. 뭘 더하자가 아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
마무리
이 책을 읽는 내내 등장인물들처럼 나도 혼란스러웠다.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복합적인 감정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서평에 녹아있는 것 같다. 알쏭달쏭한 드라마를 한 편 본 것 같다.
한줄평
최소 5년 뒤에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
인상깊은 문구
-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번 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번째, 세번째, 혹은 네번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는다
- 사비나의 삶이 음악이었다면, 중산모자는 그 악보의 모티프였다.
- 젊은 시절 삶의 악보는 첫 소절에 불과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작곡하고 모티프를 교환할 수도 있지만 보다 원숙한 나이에 만난 사람들의 악보는 어느정도 완성되어서 하나하나의 단어나 물건은 각자의 악보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기 마련이다.
- 영원한 회귀가 주장하는 바는, 인생이란 한번 사라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래서 산다는 것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죽은 것과 다름 없어서, 삶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름답고 혹은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잔혹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 도무지 비교할 길이 없으니 어느 쪽 결정이 좋을지 확인할 길도 없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것이다. 마치 한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그런데 인생의 첫 번째 리허설이 인생 그 자체라면 인생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 삶은 항상 밑그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밑그림’이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밑그림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초안, 한 작품의 준비 작업인데 비해, 우리 인생이라는 밑그림은 완성작 없는 초안, 무용한 밑그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