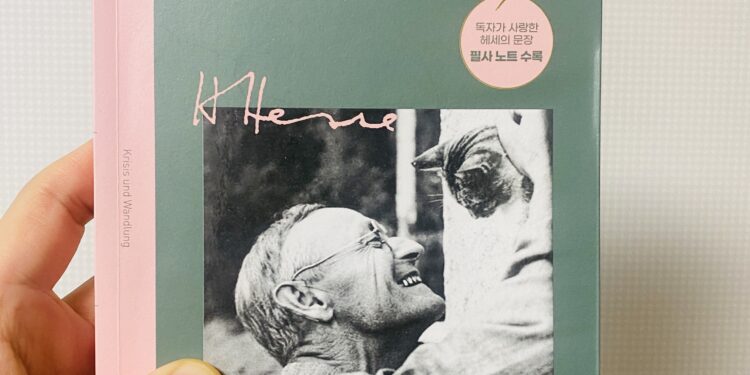몇 년 전 쿤데라의 첫 작품 <농담>을 읽고 충격을 받았었다. 아니 이걸 이렇게 쓴다고? 문장 하나 하나에 담긴 표현들도 소름 돋게 정확하면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복수(multiple)의 등장인물들의 관점을 오가면서 전개되는 주인공의 복수(revenge) 스토리는 그 자체로도 박진감 넘치는 아침드라마 한 편 뚝딱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찮은 농담 한 마디로 시작된 주인공의 불운과 그것을 복구하고자 시도하는 피땀 어린 노력을 한 순간에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즉 인생 전체가 일종의 ‘농담’임을 말하는 쿤데라식 결말에 머리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무의미의 축제>는 쿤데라가 85세에 쓴 생전 마지막 작품이다. 500페이지를 훌쩍 넘는 <농담>에 비해 전체 분량도 150페이지 가량으로 짧고, 한 장 당 한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처럼 보였다. 실제로 내용도 별 게 없다. 이름도 헷갈리는 프랑스 남자들 몇 명이 나와서 누구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고뇌하며 배꼽에 집착하고, 누구는 파리 미술관에 관광객들이 바글대는 걸 불쾌해하며 공원에서 유유자적함을 즐긴다. 누구는 안 아프면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 놓고 그걸 은근 즐기고, 누구는 외국인인 척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외계어를 창조해낸다. 이들은 파티를 즐기고, 또 누구는 예쁜 여자와 섹스도 한다. 이런 일화들이 다소 두서 없이 나열된 사이에 갑자기 구소련 독재자 스탈린의 재미 없는 농담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한다. 뭔가가 나오겠지 하는 마음에 끝까지 보긴 했는데, 마지막까지 별 일 없이−파리의 유명한 공원에서 동상에다 총을 쏘고 노상방뇨를 하는 아재가 등장해서 역시 공공질서와 위생관념 따위 없는 파리답다는 생각이 든다−소설은 마무리된다.
책을 덮으니 허망함이 몰려왔다. 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뭣도 없네. 쿤데라라고 내심 기대했는데 실망이었다. 왜 재미가 없었을까? 줄거리도 심심하지만, 재미있게 읽었던 <농담>과 비교하면 소설의 시점과 서술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농담>은 1인칭 시점에서 각 인물들의 내면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독자는 자연스레 이들의 삶을 대리 체험하면서 인물의 감정에 이입되고, 몰입감도 높아진다. 반면 <무의미의 축제>는 전지적 시점으로 기술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별다른 자세한 설명도 없다. 물론 알랭이나 라몽과 같은 이름은 부여되지만 책을 다 읽어도 이 사람들에 대해 그리 잘 알게 되었다는 느낌은 없다. 그저 이들의 머릿속을 잠시 스쳐가는 덧없는 생각들을 얼핏 흘겨본 정도의 느낌? 한 마디로 이 소설의 서술 방식은 불친절하다.
만약 이런 차이를 체스판에 비유한다면, <농담>은 체스 말의 관점에서 쓰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는 말들 하나 하나의 처절함을 담은 이야기. 그런데 알고 보니 인생은 부질없는 게임 한 판에 불과했다는, 농담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이야기. 한편 <무의미의 축제>는 말이 아니라 이들을 떠받치고 있는 체스 판의 관점에서 쓰인 느낌이다. 판은 말들과 닿아있지만, 게임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다. 그건 애당초 무의미하니까. 판(board)은 말들의 움직임을, 이 무의미한 한 판(round)의 축제를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쿤데라가 이 작품에서 노린 게 바로 이거구나 싶다. 맘대로 세상을 창조해놓고선 인간들이 무슨 짓거리를 벌이나 관망하며 낄낄대는 신의 장난처럼, 쿤데라는 자기가 만들어낸 인물들을 별다른 의도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 자알 논다 이것들아~ 초반에 쿤데라의 목소리가 잠깐 들어간 대목도 있는데, 정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 같아서 웃기다. “여러분이 알게 된 알랭, 라몽, 샤를, 칼리방, 이 네 친구를 나는 사랑한다. 내가 어느 날 샤를에게 흐루쇼프의 책을 가져다주고 모두 재미있게 즐기라고 한 것도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p. 32)”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독자들에게 쿤데라는 말한다. 인생 별거 읎어~ 책에서 뭔 거창한 의미 찾지마~ ‘거장 쿤데라’의 책에서 무언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삶의 진리와 의미를 찾으려던 사람들은 맥이 빠진다. 마치 스탈린의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화를 내던 부하들처럼. 하지만 인생의 진리, 그런 거 따위 없다는 게 바로 진리라는 거다. 책의 마지막에서 작가는 라몽의 입을 빌려 직접적으로 말한다.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이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 그걸 무의미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려면 대체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p. 147)”
책을 참 대충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론 계속 곱씹게 된다. 그래서 불편하다. 프랑크 부인의 손가락을 피해 이리 저리 춤을 추는, 잡힐 듯 말 듯 거슬리는,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맴도는 작은 깃털처럼. 무의미란 이렇게도 불편한 진실인가 보다. 깃털처럼 (무게가) 가벼운 책이지만, 내 마음을 너무도 무겁게 만든다. 아직까지도 이 책에서 재미보다는 불쾌함을 더 크게 느끼는 걸 보면, 나는 이 깃털 같은 삶의 가벼움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긴 어려운 진지한 사람인 것 같다. 나도 85살쯤 되면 이런 삶을 축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줄평: 인생 힘 빼고 가볍게 살라는 쿤데라 선생의 마지막 한 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