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아 수업은 금욕주의로 암기했던 스토아학파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준다. 아쉽게도 초기 스토아 학파의 저작은 물론이고 로마 전성기를 이끌었던 스토아학파의 저작들도 상당부분 사라졌고, 일부 발췌된 부분에서만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스토아 학자의 삶에서 그 철학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그과정을 통해 스토아 학파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변화해갔으며 결국 어떻게 사라졌는지까지 이 책은 아테네민주주의, 로마 공화정, 로마 제정에 거쳐 그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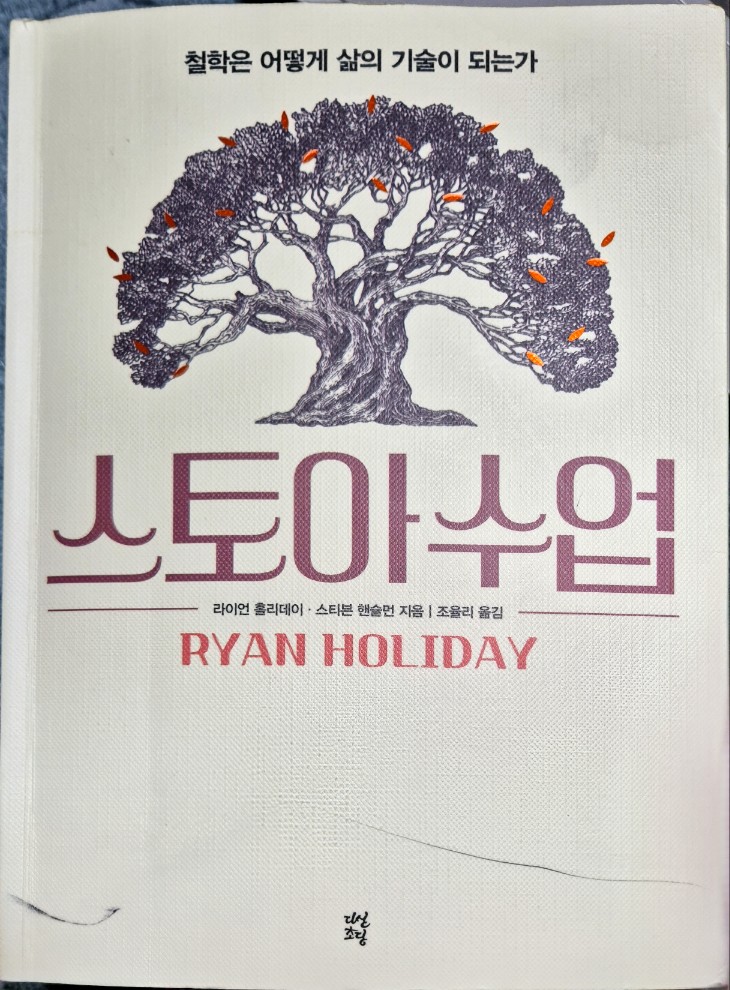
카토와 키케로
개인적으로 이 책의 백미는 카토와 키케로의 상반되는 삶이라고 할 것이다. 제논이 시작한 스토아 학파는 초기에는 개인적인 수양만을 강조하며 삶의 자세로서 발전해갔다. 덕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어떻게 그 덕에 맞추어 살아갈지와 같은 추상적인 인생의 태도에 머루는 것이 초기 제논의 스토아 학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로마의 출현과 함께 스토아 학파는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국가공동체의 영역으로 그 사상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카토와 키케로는 로마의 공화정이 끝나고 제정이 시작되는 시대의 인물로 역사의 파도 앞에 상반된 스토아 학파의 행동을 보여준다.
먼저 소 카토는 순교자다. 공화정에서 절대 1인이 아닌 2인 이상의 지도자가 함께 권력을 나눠갖고 견제하고 대항하며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스토아적인 것으로 두고 이러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순교한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의 죽음은 다소 불필요하다고도 보여지고 동시에 그의 고집이 어느정도인가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소 카토는 그 이후 스토아 학자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된 학자로 스토아가 추구하는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한 자라고 할 것이다. 카토는 신념을 위해 살아가는 자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강한 의지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역설적이게도 로마 공화정의 끝에서 향후 로마 제정에서 거대 제국을 이끌 스토아학파의 가장 본질적인 신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키케로는 카토와는 상반된다. 매우 속물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념마저 굽힐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키케로를 순수한 스토아 학파의 학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어디까지나 키케로 또한 스토아 학파의 학문적 기풍을 따라 가는 학자였으며, 키케로 이후 스토아 학파는 현실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종합학문과 같이 발전하였음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키케로 또한 스토아 학자라 할 수 있겠다. 키케로가 보여주는 스토아는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학문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로마는 매우 실용적인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로마의 실용성만 중시하는 그 철학을 낮잡아 보았다. 그러나 아테네는 결국 로마에 멸망하였고, 아테네를 떠난 스토아학파는 개인의 수양을 넘어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철학이 되어가고 그 과정에 키케로는 세네카 이전에 가장 현실적인 스토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키케로와 카토는 결국 대제국 로마를 이끈 스토아의 2가지 측면인 신념으로서 스토아와 현실을 위한 학문인 스토아를 각각 보여주면서 로마 제정에서의 국가 운영체제가 된 스토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
동양에는 유교가, 서양에는 스토아가
개인적으로 스토아 학파를 읽으면서 동양의 유교를 생각하게 되었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로 대표되는 수많은 사상이 범람했으나 결국 동양에서는 유교가 그 모든 사상을 흡수하며 최종적인 승자로서 동양문화의 본질을 이루게 되었다. 소위 충 효 예로 대표되는 유교의 기본 사상은 스토아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개인의 수양을 위한 사상에서, 점차 현실적인 정치에 도입되어 가면서 특정한 행동을 추구하는 사회규범으로 자리잡게 된다. 대표적인것이 충(忠)이다. 처음에는 군신관계에 있어서 충의를 상징하던 충은 점차 그 모습을 변화시켜가며 군신관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사이에 믿음을 뜻하는 의미로 굳어 갔고 현재에는 충은 나라와 사람을 넘어, 회사, 가수, 운동선수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효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를 지나 가정 내 노인 부양의 제도로 정착하면서 동양사회에서는 얼마전까지도 노인 부양은 자식 몫이고 국가의 몫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유교는 단순한 개인 수양을 넘어 동양사회 근간을 이루는 사회 규범이 되어 왔다.
스토아 또한 마찬가지이다. 제논의 스토아는 결국 세네카의 스토아가 되었고 결국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되었다. 제논은 사회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덕을 강조하였고, 세네카는 덕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규범을 논하였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중간에서 덕을 명확하게 하고 그를 이루는 규범을 정리하여 덕을 이루기위한 개인의 반성적인 삶을 자세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스토아는 발전해오며 거대 제국의 소프트웨어로서, 서양의 이성으로 대표되는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게되었다.
이처럼 유교와 스토아는 그 지향점은 다르지만 결국 동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면서 비슷하게 발전해왔다.
예정된 비극과 부활
오현제의 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끝으로 스토아는 쇠퇴하고 결국 카톨릭이 로마의 정교가 되면서 스토아를 대체하게 된다. 더나아가 로마 멸망 후에는 중세가 되어서는 스토아의 학문적 기풍은 파괴되고 카톨릭의 신학이 그를 대체하여 스토아 학파라면 비현실적이라며 비웃었을 “핀 위에 천사가 몇명이나 춤을 출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로 서양 철학은 채워지게 된다.
물론 중세 이후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스토아학파의 기조는 스토아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였고 그런 스토아적 사고가 결국 서양 근대철학의 근간을 이루며 유럽을 다시 한번 세계의 패자로 만들어주었지만, 카톨릭이 스토아를 대체한 중세는 서양문화의 암흑기로 불릴 정도로 과거 로마 제정의 위대한 사상이었 스토아를 단절되게 하였다.
이데올로기의 종말 그리고 철학의 부활
이렇게 거대 제국을 이끌었던 스토아 학파를 보면서 철학이 없어진 현대사회의 다음 모습에 대하여도 생각해보게 된다. 동서양할 것 없이 20세기 극한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지나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함께 맞은 21세기는 어느새 4분의 1이 지나갔다. 인류는 21세기와 함께 그 어떤 시대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상 열어보니 21세기 현재 세계 각국은 비이성적인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위대한 통합의 정신은 어느새 무너져 각자도생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마치 로마 공화정이 끝나고 제정이 시작될 때와 같이, 중세의 혼란이 사라지고 르네상스의 바람이 불어오던 시절과 같다. 이런 시절은 결국 위대한 철학을 소환했고, 위대한 철학의 힘으로 다시 위대한 인류의 시대를 열어 왔다. 21세기도 현재 그 어떤 때보다 혼란스러운데, 곧 이러한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발전의 씨앗이 되어줄 로마의 소프트웨어인 스토아와 같은 새로운 철학이 부활하길 기대해본다.
한줄평
서양철학의 근간을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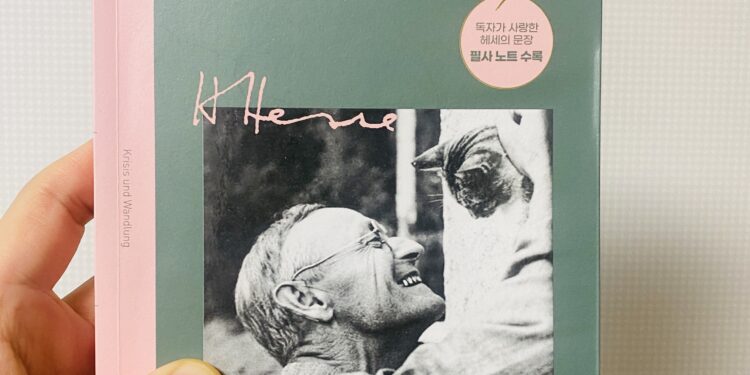
![[발제문] 삶을 견디는 기쁨](https://stew.or.kr/wp-content/uploads/2026/01/다운로드-340x1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