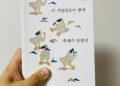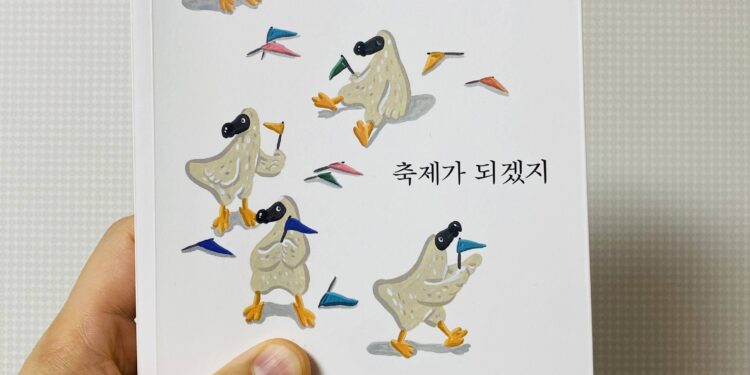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을까요?
의학·식품·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바츨라프 스밀이 지적했듯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우리 또한 ‘행복을 위한 기술’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우리는 지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 인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장 속도를 늦추는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필요한 희생’으로 볼지 ‘불필요한 제약’으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2. 청년·비정규직의 노동 불안정, 연금 기금 고갈, OECD 최고 수준의 노년 빈곤율을 고려할 때,
기존 사회 안전망을 고려하여 현 모델을 보수시키며 유지하는 것과 일부 세대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 중 어느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3. 최근 기후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특히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츨라프 스밀은 이를 주로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플레이션의 부담을 기업, 소비자, 정부 중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공정할까요?
4. 바츨라프 스밀에 따르면 세계화는 자원의 흐름과 경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화가 선진국에는 값싼 제품과 부를 제공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는 노동자와 환경의 희생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계화의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이면 중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번외
- 주 4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생산성은 유지하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주 4일제, 하지만 기업 경쟁력 저하와 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 4일제는 “삶의 질”의 혁신이 될까요 아님 현실성 없는 환상일까요?
2. 서울의 집값은 젊은 층에게 벽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대 중심의 삶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님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