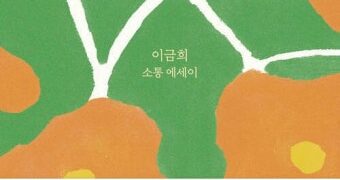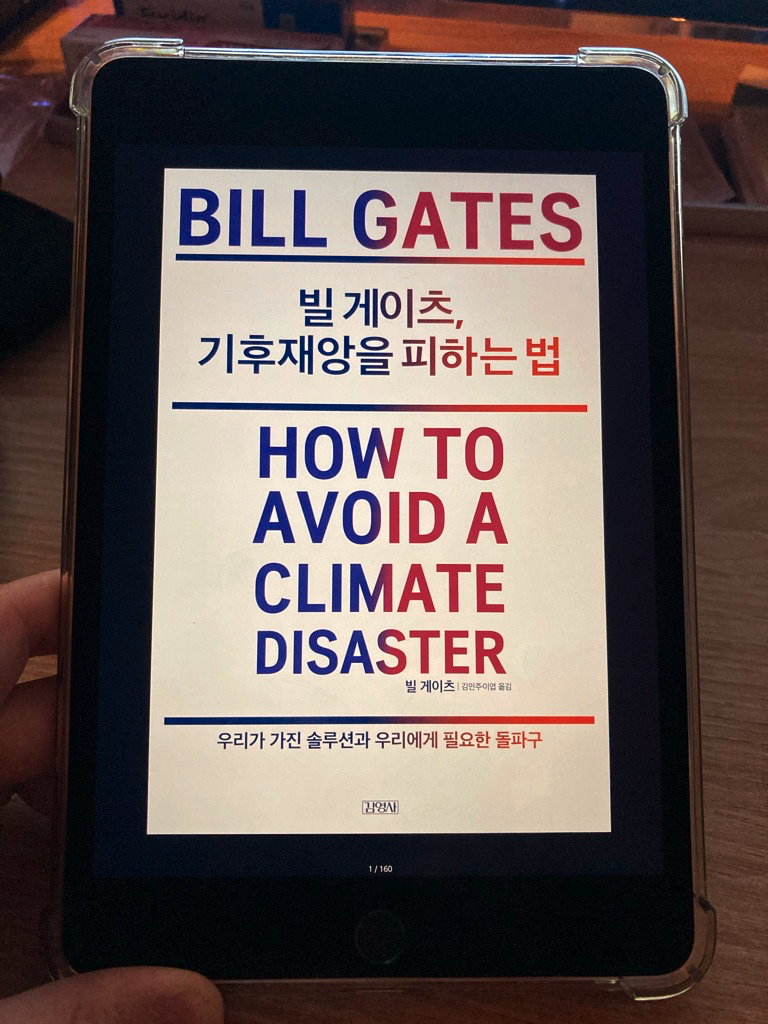솔직히 고백하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환경이나 기후변화, 탄소배출과 같은 문제는 내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신문 기사만 훑어보아도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막연하게만 느껴져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왜 우리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다양하고 적절한 논거를 통해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나의 편견을 불식시켰다.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은, 기후 온난화를 막지 못할 경우 비단 그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억 명의 사람들이 현재보다 더욱 혹독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자신들의 몸과 가축, 재래 기구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순식간에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 매우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인류의 가장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법과 정책이 기술의 발전이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비판한 점도 개인적인 경험과 맞물려 기억에 남는다. 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속도로 법규범이 변화한 적은 본 적이 없다. 법규범 자체의 속성이 그래야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법규범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잖이 경험했다. 우리나라도 작년 말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는데, 앞으로의 환경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법규범이 어떻게 선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노력이 단지 선진국들의 완전한 “선의”에 의지한 “의무” 내지는 “인류애”에 기대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희망적이었다. 선진국이 훌륭한 제로 탄소 기업과 사업을 구축함으로써 다음 세대에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이를 고객인 개발도상국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저자가 환경에 관한 한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수 년간의 연구를 통해 전문가에 버금가는 수준의 환경지식을 쌓았다는 면도 감탄스러웠다. 아마 이 분야에 관해서는 기본서 내지 입문서로서 자리매김할 정도로 훌륭한 책인 것 같다. 타인에 대한 사랑, 배려에 기반한 저자의 진지한 고민과 자세를 느낄 수 있어 무척 좋았다. 내가 저자와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시민으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